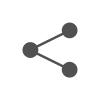수백만년 전 빙하는 노르웨이를 피오르(Fjord)의 나라로 만들었다. 빙하가 침식해 생긴 거대한 골짜기에, 바닷물이 흘러들어 거울처럼 맑은 협만을 이뤘다. 이렇게 생긴 피오르가 노르웨이 서부 전역에 펼쳐진다. 다 합치면 2500㎞에 달하는 거대한 물길이다.
노르웨이에 있던 일주일 내내 한 일이라곤, 피오르를 기웃거리는 게 전부였다. 피오르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눈 돌리면 잔잔한 물결, 또 깎아지른 절벽과 설산이었다. 다행인지 해는 좀처럼 지지 않았다. 새벽 4시께 날이 새 밤 10시가 돼서야 해가 넘어갔다. 고무보트를 타고, 전기차를 몰고, 암벽에 오르며 여러 번의 긴 하루를 보냈다. 그나마 단시간에 피오르를 유람하는 가장 역동적인 방법이었다.

노르웨이는 우리네 한반도처럼 국토 대부분이 산지고, 삼면이 바다다. 한데 그 육중한 땅의 안쪽, 깊숙한 협곡까지 피오르가 파고든다.
서해안 항구도시 베르겐에서 돛을 올린 유람선은 4시간 만에 발레스트란에 닿았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거대한 피오르와 가장 좁은 피오르가 교차하는 해안 마을이다. 가장 큰 피오르인 송네피오르는 204㎞의 물길로, 최대 수심이 1308m, 최대 폭이 4㎞에 이른다. 가장 작은 피오르인 내뢰이피오르의 폭은 250m에 불과하다.
 발레스트란에선 보트나 카약을 타고 협곡을 누비는 액티비티의 인기가 높다. 12인승짜리 고무보트를 타보기로 했다. 점프슈트·구명조끼·고글을 나눠줄 때만 해도 몰랐다. 웬걸, 동네 가이드 토르의 배는 해병대가 탄다는 고속단정(RIB)이었다. 뱃머리를 꼿꼿하게 세운 고무보트는 내뢰이피오르까지 90㎞ 속도로 질주했다. 토르가 “운 좋으면 고래랑 물개도 보고…” 또 뭐라고 하면서 웃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바람과 진동에 몸이 날아갈 듯했다.
발레스트란에선 보트나 카약을 타고 협곡을 누비는 액티비티의 인기가 높다. 12인승짜리 고무보트를 타보기로 했다. 점프슈트·구명조끼·고글을 나눠줄 때만 해도 몰랐다. 웬걸, 동네 가이드 토르의 배는 해병대가 탄다는 고속단정(RIB)이었다. 뱃머리를 꼿꼿하게 세운 고무보트는 내뢰이피오르까지 90㎞ 속도로 질주했다. 토르가 “운 좋으면 고래랑 물개도 보고…” 또 뭐라고 하면서 웃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없었다. 바람과 진동에 몸이 날아갈 듯했다.보트는 내뢰이피오르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 다가가 이따금 속도를 낮췄다. 설산의 무지막지한 폭포를 맞으며 바라본 피오르는 뭐랄까, 거칠고도 아늑하다. 잔잔한 물결 위로 끝도 없이 협곡과 산이 이어졌다. 이토록 거대한 반영은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인구 200명의 산골 마을 게이랑에르는 천혜의 요새 같았다. 구불구불 물굽이를 이룬 게이랑에르피오르와 해발 1000m 이상의 설산이 마을을 완전히 감싸 안고 있었다. 곳곳에서 겨울잠에서 깬 폭포가 쏟아졌다.

게이랑에르의 길은 죄 오르막이었다. 스토르세테르 폭포로 가는 2㎞ 산길엔 야생 팬지와 애기괭이밥 같은 들꽃이 흔했다. 그 언덕진 들에서 양들이 풀을 뜯었다. 마을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유럽에서 운전은 처음인데….”
“면허증이랑 모험심만 있으면 됩니다.”
 전기차는 아무리 밟아도 시속 60㎞를 넘지 않았다. 창문이 없어 피오르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가이드 우베가 모험심을 강조한 이유는 뒤늦게 알았다. 10분 정도 비탈길을 오르자, SNS에서도 강심장만 인증샷을 찍는다는 플뤼달스유베가 나왔다. 게이랑에르피오르와 마을이 굽어 보이는 그곳은 전망대라기보다는 낭떠러지에 가까웠다. 그래도 기꺼이 끄트머리에서 인증사진을 남겼다. 다리는 후들거렸다.
전기차는 아무리 밟아도 시속 60㎞를 넘지 않았다. 창문이 없어 피오르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가이드 우베가 모험심을 강조한 이유는 뒤늦게 알았다. 10분 정도 비탈길을 오르자, SNS에서도 강심장만 인증샷을 찍는다는 플뤼달스유베가 나왔다. 게이랑에르피오르와 마을이 굽어 보이는 그곳은 전망대라기보다는 낭떠러지에 가까웠다. 그래도 기꺼이 끄트머리에서 인증사진을 남겼다. 다리는 후들거렸다.
해발 600m 외르네스빙엔 전망대에선 되레 무서움이 덜했다. 대형 페리도 호텔도, 미니어처로 보였다. 현실감이 덜했다. 아무리 줌을 댕겨도 사람이 안 보였다. 오르지 게오르피오르만을 위한 무대였다.
피오르 배경으로 암벽 타기

피오르 풍경은 유람선이나 전망대가 아니라 깎아지른 절벽에서 봐야 진짜다. 게이랑에르 북쪽의 온달스네스에선 적어도 그게 상식이었다. 유럽에서 가장 험한 산으로 통하는 트롤월(1700m)이 그곳이 있어서다. 트롤월엔 높이 1000m에 이르는 수직 절벽이 진을 친다.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모험가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단다.
다행히도 여행자를 위한 산은 트롤월이 아니었다. 그 맞은편에 동생뻘 되는 람페스트레켄(537m)이 있다. 노르웨이까지 와서 암벽 등반을 하고 싶진 않았다. 한데 산과 피오르를 함께 누리는 액티비티라는 말에 덜컥 용기가 났다. 비아 페라타(암벽에 고정한 쇠말뚝이나 와이어에 의지해 등반하는 형식) 코스여서 안전사고 위험도 적었다.
“허리띠에 2중 안전장치가 있어요. 손을 놔도 안 떨어집니다.”

산악가이드 에림의 예상과 달리, 시작하자마자 일행 중 낙오자가 생겼다. 초입의 90도 경사 절벽을 오를 때는 곳곳에서 신음과 욕설이 섞여 나왔다. 생각해보니 안전하다고 했지, 쉽다고는 안 했다. 엉거주춤, 잔뜩 힘이 들어간 자세로, 2시간 만에 360m 높이의 롬스달세겐 절벽에 섰다. 절벽을 등지고 낭떠러지 밑을 봤다. 거칠 것 없는 풍경이었다. 왼쪽엔 트롤월이, 오른쪽으로는 온달스네스피오르가 파노라마로 열렸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온달스네스피오르를 물들이고 있었다.